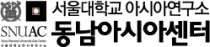2019년 4월 6일 중앙sunday 보도
[문화비평 – 미술]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잇는 실험미술
냉전시대의 ‘사실주의’와 ‘추상회화’가 공산권과 자본주의 진영을 양분한 미술언어였다면, 아시아의 실험미술은 행위와 영상·사진 등 제3의 미술언어를 통해 냉전이 초래한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했다.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과천국립현대미술관)은 ‘화이트큐브(미술관)’의 닫힌 공간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 아시아 13개국 작가들의 17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군부독재와 계엄령, 국가주도 경제개발의 부작용 등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의 작품들로, 작가는 주저 없이 자신의 신체를 사진과 행위예술의 매체로 사용했다.
대만 작가 장자오탕의 1962년 작 ‘판챠오’는 ‘머리가 사라진(headless)’ 초현실주의적 신체 사진이다. 고향 판챠오를 배경으로 촬영된 몸통뿐인 신체는 국민당 치하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작가의 ‘분노와 무기력’을 섬뜩하게 전달한다. 대만의 천지에런은 ‘역기능 3호(1983)’에서 머리에 사형수가 쓰는 용수를 뒤집어쓰고 고함을 지르며 시먼딩 거리를 활보하였는데 이는 34년간 지속된 계엄령의 폭압과 금지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작가의 명백한 저항이었다. 1992년 태국의 군사 쿠데타에서 촉발된 바산 시티켓의 ‘내 머리 위의 부츠’에서는 작가가 커다란 군화를 아슬아슬하게 머리 위에 이고 길을 건너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도시노동자의 삶에 스며든 군사정권의 위력을 폭로하였다.
![산토스 , ‘매니페스토’, 1987, 157.6x254.3㎝ 국립싱가포르미술관 소장. [사진 과천국립현대미술관]](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904/06/378f40a4-2cb7-4d79-a233-72879f49a4d4.jpg)
산토스 , ‘매니페스토’, 1987, 157.6×254.3㎝ 국립싱가포르미술관 소장. [사진 과천국립현대미술관]
공권력과 충돌한 예술은 종종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작가 ‘Group Five’는 1974년 정부 대변인으로 전락한 미술아카데미의 작가들에게 ‘미술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화환과 함께 표현의 다양성을 요구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어진 검거와 체포가 학생운동과 결합하면서 ‘신미술운동’이라는 전위미술운동이 탄생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 정권이 100여명의 반정부인사를 무차별 구속한 1984년의 ‘랄랑작전’을 계기로 웡호이청과 같은 작가이자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를 배출하기도 했다.
‘회화’의 사회비판적 기능은 시민운동과 결합한 미술단체를 통해 부활했다. ‘태국예술가연합전선’은 1973년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학생운동과 결합하여 대규모 가두회화전을 조직했다. 1976년 계엄령 하의 필리핀에서 결성된 ‘카이사한’은 마르코스 독재에 항거하며 학교와 거리, 광장에서 제작한 벽화를 통해 미술의 파급력을 대중 속으로 확산했다. 파블로 바엔스 산토스가 1987년 완성한 유화 ‘매니페스토’는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 장면들을 몽타주 기법으로 화면에 배치하였다.
이 같은 동남아의 전위예술은 유신시대의 폭압을 해프닝과 실험영화로 풀어냈던 한국의 미술가 그룹 AG(Avant Garde)를 연상시키며, 카이사한의 벽화운동은 1980년대 한국의 민중미술을 떠올린다. 시공을 초월한 이 같은 ‘미학적 공명’의 기저에는 공통된 정치사회적 모순이 있었고 이를 예민하게 지각하는 작가의 날 선 시선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21세기 한·중·일 삼국을 넘어 범아시아적 시각에서 현대미술을 바라봐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주현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