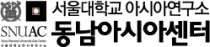3대 교역국으로 급부상한 베트남, 경제·안보 협력 중요성 커지는 인도네시아
‘넥스트 차이나’, 즉 중국 다음의 투자·생산 거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단순히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거론되던 이 키워드는 16년이 지난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 열쇠가 됐다. 세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던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미·중 경쟁 격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사활을 걸고 넥스트 차이나를 찾아내지 않으면 고립과 쇠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최근 한국이 주목하는 넥스트 차이나 시장 가운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대(對)중국 무역이 주춤한 사이 대베트남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어느덧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534억7953만 달러, 수입은 259억4178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275억3775만 달러로 집계됐다. 794만 달러가 넘는 전체 교역 규모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는 30년 이상 지난 현재 150배 넘게 커졌다. 교역 품목은 직물, 의류 등 노동집약 상품에서 반도체, 휴대전화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진화했다. 일본(766억5708만 달러)을 2년 연속 ‘톱3’ 자리에서 밀어낸 대베트남 무역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무역·투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후 현지 공장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고, 베트남이 이를 가공해 완성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구조다. 앞서 중국이 한국에 한 역할 그대로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과의 치열한 전략 경쟁 속에서 ‘내수 중심 성장’을 기치로 중간재 자급률을 올림에 따라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30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대중 무역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했다. 한국에 베트남은 대중 무역 적자의 충격을 완화해줄 ‘귀인’인 셈이다.
물론 베트남을 완전한 중국 대체재로 여기기에는 갈 길이 한참 멀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중국(2676억6000만 달러)의 30% 수준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10개국이 경제공동체를 이룬 아세안 전체로 시야를 넓혀 진출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아세안 내 ‘친한(親韓)’ 국가로 부상했다. 지난해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91억4023만 달러다. 전체 수출국 중 1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수출입 규모라는 수치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채굴과 제련에서 음극재, 전구체, 배터리셀, 배터리팩 생산, 배터리 유통 및 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정부·국영기업 주도로 구축해 왔다. 배터리 제조기술이 뛰어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핵심 광물을 원활히 조달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2억8000만여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갖췄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연령)은 29.7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약 70%다. 노동의 질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월평균 급여가 307만 루피아(약 26만2500원)로 인건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두터운 젊은 층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자상거래 발달을 이끄는 점은 소비시장 측면에서의 경쟁력으로 다가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는 “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단순 흥미로 시작돼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한류 붐도 소비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