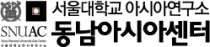엄은희(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발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화산, 백사장, 바다 등 천혜의 자연이 선사하는 절경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족사원, 상점 앞, 마을마다 세 개 이상씩은 있는 마을 공동사원에 공물을 바치며 향을 피우는 삶과 종교가 밀착한 발리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진1> 점심공양을 바치는 여성
‘천국의 섬’ 발리. 이 이미지는 고갱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타이히에 비견되는 식민관광 섬을 만들고자 했던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계획에 의해 ‘부여된’ 것이지만, 발리인들 역시 단순 동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섬의 ‘관광화’, ‘이국화’에 기여하며 여전히 ‘천국의 섬’이라는 타이틀을 대표적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다.
발리는 여러 면에서 한국의 제주를 생각나게 한다. 화산섬이라는 자연조건, 본토(자바섬과 반도)와는 상당히 다른 종교나 진한 사투리를 포함하는 특유의 문화적 차별성, 남국을 연상시키는 이국의 정취,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덕분에 내외국인의 전폭적 사랑을 받는 결과 섬의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현재 산업화된 관광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 조건들인 자연 및 문화적 조건들을 가히 착취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가 중국자본과 육지 자본에 잠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빚어온 발리의 논밭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관광에 의해 주민들이 ‘구축(驅逐)’당하는 현상도 강화되고 있다.
<사진3> 잠식되는 논들. 우붓의 농가는 곳 호텔로 개축될 예정이다
이번 발리 방문은 자기잠식적 발리의 변화에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른 방식으로 발리를 지키고 또 발리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석유엔진에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허벅지 힘으로 오래오래 논둑길을 걷고 자전거를 타는 생태여행. 지역 환경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되 자긍심 넘치는 농민인 주민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스테이’ 방식의 대안 여행이 바로 그것이다.
<사진4> 발리 공정여행 네트워크 JED와 이들을 지원하는 비수누 재단의 사무실
속도를 줄이고 눈높이를 낮추면 다르게 보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극장무희의 진한 화장으로 대변되는 발리의 ‘공인’ 문화 넘어 노동하는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발리인들의 민얼굴을 만날 수 있다. 비는 많은 편이지만 섬이라는 조건상 물은 관광을 넘어서 발리인들의 생존에 필수가결한 공공재일 수밖에 없다. 발리 전통의 관개시스템이자 농사공동체인 수박(Subak)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까지 등재된 이유는 그래서 자명하다. 그런데 저지대뿐 아니라 이제는 중산간의 수박도 붕괴하고 있단다. 관광의 압력 때문이란다. 중산간 고원지대에서 물이 부족해 논농사 대신 커피농사를 짓는 마을들에는 건조 수박(dry Subak)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여행을 통해 얻은 로컬 지식이다.
<사진5> JED 네트워크의 키아단 펠레가 마을의 새벽
<사진6> 전 수박리더 와얀 씨의 밭에서. 1ha 남짓의 그의 농장에선 20가지 이상의 작물이 자라고 있다
<사진7> 커피콩도 암수가 있다
사실 이런 식의 관광은 일반화된 대중관광에 비해 가격이 더 높다. 그렇지만 이것이 비싼 것이 아니라 발리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응당한(fairly)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확신도 얻게 되었다. 대중관광이 지닌 민주적 속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거대산업이 된 ‘관광유희’를 넘어 자본에 포획되지 않은 그들의 심심하게 치열한 일상을 잠시 엿보았다. 걷기, 경건해지기, 관광 서번트 아니라 자신의 곁을 잠시 허락하는 발리 친구 만나기. 이러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갈 때 보존을 위한 재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 나아가 발리인들이 스스로 내세운 자연-신-인간의 조화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믿게 될 듯 하다.